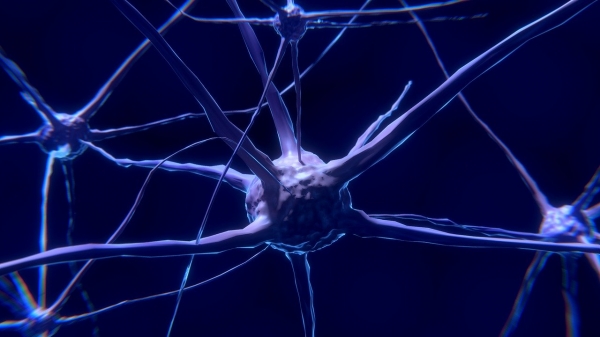
치매의 근원적 치료제 개발이 연이어 실패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 위험인자에 대한 규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치료제 개발 지연에 따라 예방으로 치매 관리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위험인자의 규명은 중요성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치매 예방 등을 목적으로 치매 위험인자 규명연구가 다양한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에 대한 대표적 위험인자는 ▲사회인구학적 위험인자 ▲유전적 위험인자 ▲생활습관 및 환경적 위험인자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등이다.
먼저 난청과 치매에 대한 연관성 규명도 활발하다. 인구 고령화로 난청이 늘어나면서 치매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고 있어서다.
최근 중앙대병원 이비인후과 장문영 교수는 난청이 해마의 시냅스를 뇌손상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기전이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결국 난청이 치매의 위험 인자로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청각 재활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성 난청 인구는 약 18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외에도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으로 뇌의 사용도가 줄어들어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켜 치매가 올 수 있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최근 60세 이상 노인에서 심방세동이 치매 발생 위험을 1.5배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정보영 교수 연구팀은 건보공단 자료를 통해 60세 이상 환자 26만명을 대상으로 심방세동 환자(1만435명)와 그렇지 않은 환자(2만612명)로 분류해 치매 발생 위험도를 조사했다.
7년 추적 관찰 결과, 심방세동 환자 2,536명(24.3%)에서 치매가 발생했다. 치매 형태별로는 혈관성 치매는 2배, 알츠하이머병은 1.3배 발생 위험이 높았다.
심방세동은 심장이 무규칙적으로 아주 빠르게 뛰는 증상으로 빨리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뇌졸중이나 심부전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도 치매와 연관된 중요한 요소로 규명이 활발하다. 최근에는 노년기에 허리둘레가 클수록 치매 발병의 위험성이 높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고려대 구로병원 내분비내과 류혜진 교수팀은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한 65세 이상 87만2,082명을 7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치매 발병률과 허리둘레와 체질량지수 연관성을 밝혔다.
연구 결과 복부비만을 가진 정상 체중 노인의 경우, 복부비만이 없는 정상 체중 노인에 비해 남성의 경우 15%, 여성의 경우 23% 치매 위험이 증가했다.
류혜진 교수는 노령층에서 비만과 연관된 치매 위험성을 평가할 때 허리둘레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 의의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수면, 미세먼지, 심장박동,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 기존에 규명됐던 위험인자들에 대한 추가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결국 치매 발병의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각종 위험인자의 관리가 예방과 중증화 지연의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치매의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각종 질병과의 연관성 등도 꾸준히 규명될 전망이다.
한편, 치매는 다양한 원인 질환에 의해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는 일종의 증후군(syndrome)으로 치매의 약 9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는 상당수 위험 인자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