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연구진, 논문 24편 메타분석...의료진·간병인 중심이 75%
디지털 문해력 부족, 맞춤형 교육 부재가 주요 걸림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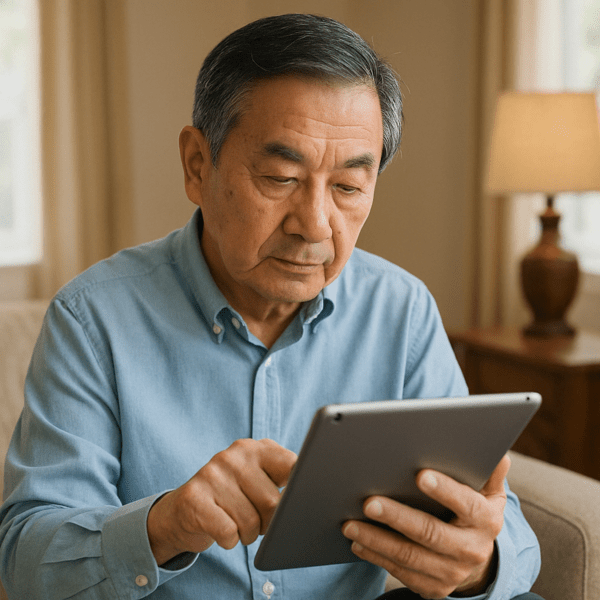
웨어러블 기술, 스마트홈 시스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치매 환자의 자가관리(Self-management) 디지털 솔루션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 당사자들이 이러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스트래스클라이드대(University of Strathclyde) 연구팀은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9개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835편의 관련 논문 중 24편을 선별해 디지털 기술이 치매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과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연구 대상자들은 주로 70~80대 고령층으로 구성됐으며, 상당수가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었다.
연구 결과, 전체 연구의 75%에 해당하는 18편이 간병인이나 의료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중재를 다뤘다. 반면, 치매 환자가 직접 조작하고 이용하는 기술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21%(5편)에 불과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편중 현상의 배경으로 고령 환자의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부족과 개인별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부재를 지적했다. 고령 치매 환자는 인지 기능 저하와 신체적 한계, 기술 경험 격차로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와 함께 개별 교육이 병행돼야만 디지털 솔루션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연구 중 88%(21편)가 사용자 교육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이용 절차를 상세하게 제시한 사례도 17%(4편)에 그쳤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부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을 디지털 솔루션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로 인식했다. 한 연구는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2배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자 훈련에 배정했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훈련이 이용자 자신감을 높이고 기술 도입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치매 환자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이 단일 기능 위주로 설계돼 결과적으로 여러 앱을 병용해야 하는 복잡성을 가져온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연구팀은 “치매 환자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고 기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설정을 요구하는 현재 기술 환경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접근성 문제를 완화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22일(현지 시간)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국제 학술지인 ‘JMIR(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에 온라인으로 실렸다.
Source
Cornelius G, Hodgson W, Maguire R, Egan K. Wearable Technology, Smart Home Systems, and Mobile Apps for the Self‑Management of Patient Outcomes in Dementia Care: Systematic Review. J Med Internet Res 2025;27:e653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