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츠하이머, 파킨슨 등 조기 진단을 위한 혈액 바이오마커 최신 연구 발표
국내외 레카네맙 투여 사례도 소개...디지털 바이오마커 등 다양한 분야 공유

높은 경제성과 접근성으로 최근 학계와 산업계에서 활발하게 연구되는 혈액 기반 바이오마커의 최신 기술과 이에 대한 조기 진단 활용 전망을 공유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투여가 시작될 예정인 초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인 ‘레켐비(Leqembi, 성분명 Lecanemab)’의 국내외 실제 임상 사례와 현실적 과제, 해결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한국노년신경정신약물학회는 지난 22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 이건희홀에서 ‘단백병증의 약물과 혈액 바이오마커: 현재와 미래(Drugs and Blood-Based Biomarkers(BBM) of Proteinopathy: Present and Future)’를 주제로 제22차 학술대회를 열었다.
첫 번째 세션인 ‘Featured Session: BBM, therapeutics, and monitoring’에서는 김정란 충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김종민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첫 번째 연자인 김근유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아밀로이드 베타(Aβ)와 타우(Tau) 단백질 등을 중심으로 알츠하이머병 진단에 쓰이는 다양한 바이오마커들의 개발 역사와 특징을 소개하고, BBM 관련 최신 연구 흐름 및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기존 알츠하이머병 바이오마커 검사 방식인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이나 뇌척수액(CSF) 검사의 단점으로 고비용과 침습적 특성, 낮은 접근성 등을 한계로 지적하고, BBM의 개발 현황과 장단점 분석, 임상 적용 가능성에 대해 폭넓게 검토했다.
타우병증과 관련해서는 혈장 바이오마커인 ▲p-tau181 ▲p-tau205 ▲p-tau217 ▲p-tau231 ▲MTBR tau243 ▲BD-tau의 특징을 비교하며 특히 p-tau217의 높은 정확도와 잠재력을 강조했다.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 업체 중 혈액 바이오마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전문기업으로는 미국 C2N 다이어그노스틱스(C2N Diagnostics)를 언급했다.
임상적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이지만 p-tau217이 내년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임상(preclinical)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레카네맙이나 도나네맙(Donanemab, 상품명 키선라 Kisunla)에서 BBM이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도 짚었다. 도나네맙의 경우 임상시험에서 PET이 아닌 혈장 p-tau217만 적용한다.
또 BBM 검사를 임상에 사용할 때 진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높은 양성률과 음성률의 사이에서만 PET이나 CSF 검사를 적용하는 ‘투 컷오프(Two Cut-off)’ 접근법을 소개했다.
다만 인종별로 아밀로이드 양성률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분석됐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투 컷오프에 대한 학계의 컨센서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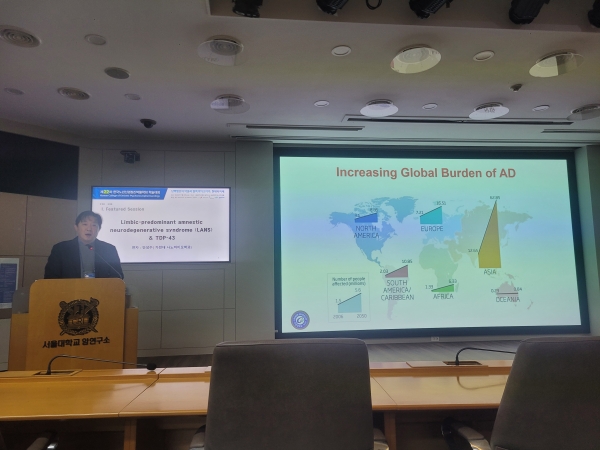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유한수 강남세브란스 신경과 교수는 루이소체 치매(Lewy body dementia)와 파킨슨병에서의 α-시누클레인(α-synuclein)에 대한 최신 연구 동향을 발표했다.
α-시누클레인은 14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이다. 신경세포 말단에서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dopamine)의 분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루이소체는 α-시누클레인이 비정상적으로 응집해 뇌간과 대뇌피질 부위에 쌓인 단백질 덩어리로, 뇌 신경세포 손상을 유발한다.
파킨슨병은 중뇌의 흑질(substantia nigra) 부위에서 도파민의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이소체는 파킨슨병의 병리적 특징이다. 다만 루이소체 치매와 파킨슨병과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다르다. 루이소체 치매는 치매 증상이 먼저 나타난 뒤 파킨슨병 증상이 생기지만, 파킨슨병은 발병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치매 증상을 보인다.
루이소체 치매와 파킨슨병은 알츠하이머병보다 바이오마커 개발이 쉽지 않아 조기 진단에도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부 조직이나 혈액, 뇌척수액 등 다양한 조직에서 α-시누클레인을 검출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유 교수는 “파킨슨병 환자는 질병이 50% 이상 진행된 후 진단되는 경우가 많아 질병조절치료제(Disease-modifying Therapies, DMT)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질병의 진단 바이오마커인 α-시누클레인과 도파민을 확인하는 데 주로 CFS 검사가 시행된다. 유 교수는 침습적이고 절차가 불편한 CFS 검사에 비해, 임상적 상용화에는 아직 한계가 있으나 경제성이나 접근성 등 다양한 부분에서 장점이 큰 BBM의 발전 가능성을 더 높이 평가했다.
그는 “알츠하이머병보다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이 더 다양하지만 정확히 진단하고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아직 없다”며 “질병 초기부터 피 검사 하나로 질병을 구분하고 진단할 뿐만 아니라 진행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연자인 안성수 가천대 나노바이오학과 교수는 ‘LANS(Limbic-predominant Amnestic Neurodegenerative Syndrome)’와 TDP-43(TAR DNA-binding protein 43) 단백질을 주제로 발표했다.
LANS는 변연계 우세 기억상실 신경퇴행성 증후군으로, 대개 75세 이상 노인에게서 2년 이상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미한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난다. 기억력 상실로 알츠하이머병과 오인하기도 하지만 변연계에서 신경 퇴행 증상을 보이며, 중증도에 비해 해마 위축이 큰 것이 특징이다.
TDP-43는 유전자 발현과 RNA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 비정상적으로 변형되고 응집하면 신경퇴행성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LANS에서는 TDP-43 올리고머(oligomers)가 주로 변연계 부위에 발생한다.
안 교수는 TDP-43의 구조와 기능, 병리학적 역할을 설명하고,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전측두엽 치매(Frontotemporal Dementia, FTD) 등 다양한 퇴행성 뇌질환에서의 TDP-43의 역할을 설명했다. 또 TDP-43 올리고머가 다양한 신경퇴행성 뇌질환의 중요한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BBM 개발 가능성에 대해 공유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레카네맙의 실제 임상 사용 경험과 향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연사로 전소연 충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미국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레카네맙의 치료 프로토콜과 관련된 실무적 이슈에 초점을 맞춰 발표했다. 전 교수는 환자 선정 기준부터 투여 과정, MRI 모니터링의 중요성, ARIA(Amyloid-Related Imaging Abnormalities) 등 부작용 관리 방안에 대해 짚었다.
두 번째로 연단에 선 왕성민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여의도성모병원에서의 레카네맙 도입 과정과 경험을 실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병원 내 다양한 부서와의 협력 체계 수립, 투여 프로토콜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과정, 실제 투여 사례 등을 소개했다. 특히 ARIA 등 부작용 의심 시 신속한 MRI 촬영이 가능하도록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젊은 연구자들의 혁신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혜지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CRP(C-reactive Protein)와 알츠하이머병 바이오마커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CRP는 간에서 생성되는 단백질로 면역체계 내 염증이나 조직 손상이 있을 때 혈액 내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비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CRP와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신경퇴행 바이오마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비선형 관계를 확인했다.
양희원 충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디지털 바이오마커와 관련해 음성, 도형 이미지, 영상특징 등 멀티모달 데이터를 활용한 인지장애 진단 AI 모델 개발 연구를 소개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정상, 경도인지장애(MCI), 치매를 구분하는 모델을 구축했으며, 음성 데이터가 단일 모달리티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김진학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원은 터치스크린 기반 동물 행동 평가 시스템 개발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인간과 유사한 방식으로 동물의 인지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스코폴라민(Scopolamine)을 통한 아세틸콜린 신호 차단을 활용해 인지기능 장애 마우스 모델을 만들어 신약의 효능을 평가하는 플랫폼이다.

- 에자이 CEO “레켐비, ‘피하 자동주사기’·‘혈액 바이오마커’가 게임체인저”
- ‘축복’인가 ‘재앙’인가...알츠하이머병 혈액 검사 상용화의 딜레마
- IWG “인지 정상이면 일상적 알츠하이머병 바이오마커 진단 검사 말아야”
- 獨 연구진 “혈액 바이오마커, 일차 의료서 고령층 알츠하이머병 조기 발견 도와”
- 알츠하이머병으로 오인하는 새로운 기억장애, ‘LANS’
- 국내 연구진 “백질 패턴 바이오마커로 알츠하이머치매 조기 진단 기술 개발”
- 알츠하이머병 진단에 ‘음성 디지털 바이오마커’ 분석...KERI도 도전장
- [ASPAC 2024] ‘치매·우울증·섬망, 더 나은 치료법’...대한노인정신의학회, ASPAC 2024 개최
- [ASPAC 2024] ASPAC 2024 개막, ‘3D 증후군의 더 나은 치료법' 조명
- AI가 MCI에서 알츠하이머치매 진행을 예측한다
- 국내 연구진, 알츠하이머병 핵심 원인인 타우단백질 제거 기전 규명
- 스웨덴·美 연구팀 “루이소체 치매 환자, 초기부터 뇌 대부분서 퇴화 시작”
- 美 스피어바이오 “FDA, 자사 p-Tau 혈액 검사에 혁신의료기기 지정”
- 경과원, 알츠하이머치매 개선 효과 있는 ‘금 나노 입자’ 소재 발견
- 美·스웨덴 연구진 “타우 PET 대체하는 ‘MTBR-tau243’ 혈액 검사 개발”
- “전두측두엽치매 환자 23%, 알츠하이머병 병리 동반...p-tau217로 판별”
- “알츠하이머병 혈액검사, 만성질환 많은 고령층에선 왜곡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