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인지저하증·인지증 제시
환자와 가족에 낙인·차별 느끼게 해...18~22대 국회서 ‘지지부진’

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에 ‘치매’ 대체 용어에 대해 이달부터 대국민 여론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2006년 보건복지부가 대체 용어 변경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지 약 20년 만에 ‘치매 정명(痴呆 正名)’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3일 결혼·출산·육아 관련 부정적 용어개선 정비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선 대상으로 선정된 용어는 총 32개로, 이 중 법령용어 22개에 치매가 포함됐다.
저고위는 개선 근거로 “질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담은 용어로, 환자에 대한 비하·낙인감 유발”이라고 설명했다.
후보로 제시한 용어로는 ‘인지저하증’과 ‘인지증’을 지정했다.
저고위는 치매를 포함한 32개의 용어에 대해 이달부터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 결과와 추가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정비 대상 용어와 개선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제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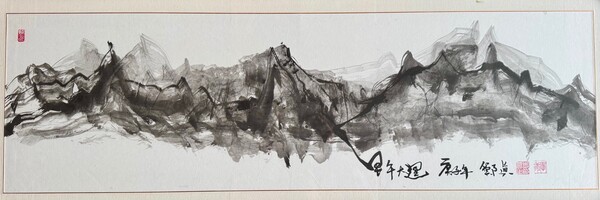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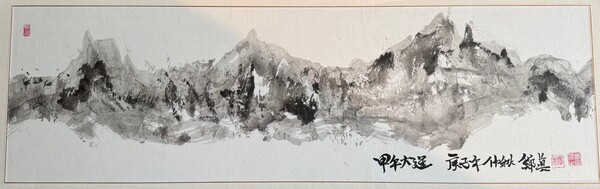
치매(痴呆)는 ‘어리석다’는 의미를 담은 부정적 한자어로, 19세기 후반 일본이 서양 의학용어 ‘Dementia’와 ‘Demenz’를 번역하면서 한자문화권에 확산됐다.
하지만 이 용어가 환자와 가족에게 사회적 낙인(stigma)과 차별(discrimination)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해 일본에서는 후생노동성 주도하에 2004년 ‘인지증(認知症)’으로 용어 변경이 이뤄졌다.
대만과 홍콩에서도 이미 오래전 각각 2001년 ‘실지증(失智症)’, 2010년 ‘뇌퇴화증(腦退化症)’으로 용어가 대체된 상태다.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가 2014년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용어 변경을 위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정치권에서도 지난 18대 국회부터 여야가 지속해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현재 22대 국회에 들어서도 4건의 치매 정명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도 의료계 등 일부 전문가 집단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는 대체 병명인 ‘인지저하증’이 임상 현장에서 다른 유사 질환과 혼선을 빚을 수 있고, 증상에 대해 가볍게 여길 수 있어 경각심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편, 저고위는 현장 정착에 시간이 걸리는 법령용어의 경우 대안 용어 병기 등 단계적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