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단현상 대처법, 나에게 관대해져라
50대를 훌쩍 넘기면서 종종 머릿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단어는 그려지는데 입에서는 내뱉어지지 않고 빙글빙글 맴돌다가 체념하고 툭 내뱉는 말이 ‘그거’다. “그거 있잖아!”라고 하면 찰떡같이 알아듣는 친구는 “그래, 그거 샀어? 잘했네!”라며 대화를 이어간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그거’를 자주 쓰게 된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머릿속에 여러 단서가 떠오르는데 마치 머릿속에 훼방꾼이 있어서 기억을 방해하는 것 같다. 동병상련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꽤 많을 것이다.

이런 현상을 설단현상(Tip of the Tongue)이라 한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로저 브라운(Roger Brown), 데이비드 맥닐(David McNeil)은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국 어딘가에 기억으로 저장되었을 텐데 기억이 인출되지 않아 이런 곤란한 경험을 하는 것이다.
설단현상으로 위축되지 말자
나이 들수록 설단현상을 자주 겪는다. 하지만 젊은 사람도 겪는다. 똑같이 특정한 단어에 대해 기억이 날 듯 말 듯 할 때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대처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나이 든 사람은 일단 어떻게든 기억해 내려고 무던히 노력한다. 기억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과 달리 나이 든 사람은 기억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면 치매 걱정이 덜컥 들기 때문이다. 젊은 사람은 그냥 스마트폰을 열어 구글 검색을 한다. 이들에게 치매나 노화는 관심거리가 아니기에 설단현상은 별거 아닌 것으로 받아들인다.
설단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하는 과정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무엇을 보거나 들었다고 모두 기억에 저장되지 않는다. 생각해 보자. 잠에서 깨면 대부분 보고 듣는 기능이 시작되기 때문에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저장한다면 오전 중에 아마 우리의 뇌는 과다 업무로 파업을 선언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뇌는 의미 있는 일들을 골라서 저장한다.
이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뇌 속의 ‘해마’다. 그래서 해마의 별명은 기억센터다. 해마는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저장할 것과 버릴 것을 빠르게 고르고, 저장할 만한 의미 있는 정보들을 장기기억으로 저장하도록 조처한다. 예를 들어, 졸린 눈 비비고 출근길을 가더라도 간판이며 지나가는 사람이며 길 위의 수많은 정보가 들어온다. 이렇게 수많은 정보 중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들을 일단 기억 후보로 인지해 뇌에 전달된다. 오늘 점심에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고르며 가게를 지나간다면 음식점 이름과 외관이 다른 가게보다 우선해 기억 후보군에 오른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 그 가게를 떠올리면서 점심 메뉴를 생각하며 즐겁게 사무실을 나갈 준비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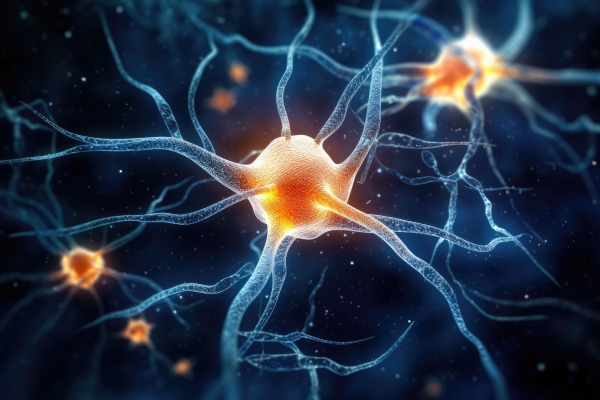
한 단계 더 미세한 세계로 들어가 기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 기억은 뇌의 특별한 장소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다. 뇌는 신체 모든 감각을 이용해 기억을 구성한다. 맛집을 찾아가서 먹은 음식을 떠올릴 때, 그냥 그 음식 이미지만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게 아니다. 음식의 냄새, 맛, 함께 먹으며 나눈 이야기, 맛이 아주 좋았다든지, 기분이 아주 좋았다든지 여러 상황이 함께 떠오를 것이다.
하나의 에피소드에 대한 기억은 다양한 정보가 묶여서 신경 신호로 변경되고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신경망의 형태로 뇌 속에 저장된다. 그래서 MRI로 기억을 떠올리는 과정의 뇌를 관찰하면, 기억을 떠올리는 동안에는 뇌의 여러 부분이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기억이 만들어졌을 당시와 비슷한 패턴으로 활성화되면 피험자는 “기억났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기억은 어떤 물리적인 실체의 장소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경망을 통해 저장된다. 그래서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방해받으면 부실한 기억을 꺼내 오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기억력을 높이기
아무리 젊은 사람도 기억력이 부실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불안하고 불편하다. 그렇다면 기억을 잘하는 비법이 있을까? 주의력과 되뇜이다. 뇌는 주의를 기울이면 의미 있는 정보를 더 잘 기억한다. 따라서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운다면 상대방이랑 인사하면서 들은 이름을 한 번 더 말하며 인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입니다.”라고 상대방이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 “홍길동 님,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식으로 한 번 더 이름을 입으로 말하며 주의를 기울이고 되뇌는 방법이 요긴하다.
누가 그랬던가? ‘적자생존’이라고. 살아남기 위해서(생존) 열심히 적어두는 것(적자)을 말한다. 기억을 보충하는 데 메모가 도움이 된다. 사실 나이 들수록 무엇을 외운다는 것이 참 힘들다. 그럴 때는 메모하자. 종이에 메모하면 그 메모지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기 힘들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자. 젊은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를 바로 스마트폰에 입력한다. 요새는 필자도 그렇게 한다. 혹자는 스마트폰에 너무 의존하면 디지털 치매가 올 수 있다고 걱정하는데, 사실 다른 것으로도 두뇌를 쓸 일이 많으니 중요한 일들은 스마트폰에 의존해도 괜찮지 않을까? 잊어버려서 난처한 상황은 피하고 봐야 하니 말이다.
노화로 인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나이 들면 예전과 달리 엉뚱한 말이 나오는 설단현상이 잦아진다. 단어의 소리와 정보를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다른데 이 두 영역의 연결이 약해지면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나이 들수록 남에게 관대해야 하지만 자신에게도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지나치게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면 스트레스만 쌓이고 이에 따라 주관적 기억 장애를 겪을 수 있다. 마음으로 관대해지는 것과 더불어 뇌 건강에 좋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양은미
(주)마음생각연구소 대표이사
세계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사)건강소비자연대 건강부총재

- [양은미 칼럼] 나이가 젊다고 인지 건강 과신은 금물
- [양은미 칼럼] 벤자민 버튼의 시간처럼 인지장애 어르신의 시간도 거꾸로 간다
- [양은미 칼럼] 잠자는 액션배우? 꿈에서 배달된 뇌 건강 옐로카드
- [양은미 칼럼] 쓱쓱 알록달록! 색칠로 두뇌를 반짝반짝 닦아보자
- [양은미 칼럼] 양은냄비에 끓인 라면은 입에는 좋은데 두뇌에는 어떨까?
- [양은미 칼럼] 경도인지장애는 ‘철학적 죽음’의 옐로카드
- [양은미 칼럼] 집 청소도 중요하고 뇌 청소도 중요하다
- [양은미 칼럼] 치매를 그냥 '인지저하증'이라고 하면 안 될까?
- [양은미 칼럼] 성큼성큼 걸으며 인지 건강을 챙겨보자
- [양은미 칼럼] 머릿속 안개 특보, 두뇌 건강에 유의
- [양은미 칼럼] 시원하게 머릿속 안개를 걷어내자
- 디멘시아도서관, ‘디지로그’로 치매 예방...‘자서전 쓰기’ 등 강의 진행
- [양은미 칼럼] 용기 있는 뮤지션의 빛나는 굿바이 투어(Goodbye Tour)
- [양은미 칼럼] 올겨울, 부모님께 장갑(glove: give-love) 선물은 어떨까?
- [양은미 칼럼] 찰나의 빛으로 남아 있는 “그때 그 기억”
- [양은미 칼럼] 신중년의 스탠딩 오더(Standing Order)
- [양은미 칼럼] 100세 시대, ‘시골 쥐와 도시 쥐’
- [양은미 칼럼] 웰다잉 준비 시작은 관계 다이어트
- 디지털 기기 사용, 치매 위험 키울까? 줄일까?
- [양은미 칼럼] 아이든 노인이든 호모 루덴스(Homo Ludens)
- [양은미 칼럼] 아름다움에 반응하는 뇌
